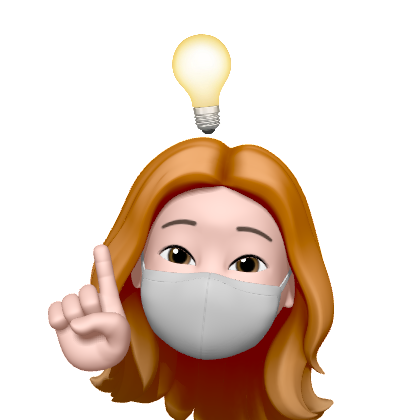2025. 2. 18. 21:11ㆍI-O Psychology/논문 리딩
Chieh-Yu Lin, Nai-en Chi. (2022). Understanding Why and When Compulsory Citizenship Behaviors Lead to Subsequent Destructive Voice and Citizenship Behaviors: The Retributive Justice and Impression Management Perspectives.

개념
강압적 시민행동(Compulsory Citizenship Behaviors; CCB): 종업원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강압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이지 않은 역할 외 행동으로 정의됨(Vigoda-Gadot, 2007). 이는 상사/동료의 요청에 따른 종업원의 비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으로 개념화되어 진정하고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시민 행동과 구별됨(Vigoda-Gadot, 2006).
형평 민감성(equity sensitivity)
분배 불공정(distributive injustice)
파괴적 발언(destructive voice)
자기 모니터링(self-monitoring)
인상 관리 동기(impression management motive)
조직시민행동(Organizatinoal Citizenship Behavior; OCB)
가설 1: 강압적 시민행동과 파괴적 발언 사이의 관계는 지각된 분배 불공정에 의해 매개된다.
가설 2: 형평 민감성은 강압적 시민행동과 분배 불공정 인식 간의 정적인 관계를 조절한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는 종업원의 형평 민감성이 높을 때 강화되고, 종업원의 형평 민감성이 낮을 때는 완화된다.
가설 3: 형평 민감성은 분배 불공정 인식을 통해 강압적 시민행동과 파괴적 발언 간의 정적 간접 효과를 조절한다: 구체적으로, 정적 간접 효과는 형평 민감성이 높은 종업원의 경우 강화되고, 형평 민감성이 낮은 종업원의 경우 완화된다.
가설 4: 강압적 시민행동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는 인상 관리 동기에 의해 매개된다.
가설 5: 자기 모니터링은 강압적 시민행동과 인상 관리 동기 간의 정적인 관계를 조절한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는 종업원의 자기 모니터링이 높을 때 강화되고, 종업원의 자기 모니터링이 낮을 때는 완화된다.
가설 6: 자기 모니터링은 인상 관리 동기를 통해 강압적 시민행동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정적 간접 효과를 조절한다: 구체적으로, 정적 간접 효과는 종업원의 자기 모니터링이 높을 때 강화되고, 종업원의 자기 모니터링이 낮을 때 완화된다.
-> 가설 전부 지지됨
비판적 사고
본 연구는 강압적 시민행동(CCB)의 양면성에 주목하여 도덕적 관점과 심리적 욕구 이론을 기반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메커니즘을 검증하였다. 이는 시민행동에 대한 외부의 압박이 종업원에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강압적 시민행동 문헌에 기여하며, 강압적 시민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종업원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시민행동과 파괴적 발언의 평균 및 분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부정적인 변인에 대해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영향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분배 불공정을 측정하기 위해 분배 공정성 척도를 역코딩하여 사용한 점에 의문이 들어 국내외 연구를 참고한 결과 별도의 타당화된 분배 불공정 척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분배 공정성 역코딩을 하여 데이터를 채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시민행동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질적인 요인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였으나 여기서 나아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조직에 좀 더 명확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맥락적 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직무 자율성을 첫 번째 경로의 새로운 조절변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 자율성이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갖는 자유와 독립성의 정도로 정의되며,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직무 자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무-자원 이론에 따르면 직무 자율성 제공은 구성원에게 직무 자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높은 직무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구성원은 강압적 시민행동을 통한 분배적 불공정을 인식하더라도 직무 자율성을 통해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에서 의사결정 및 표현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는 리더십으로 알려진 참여적 리더십과 건설적 발언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직무 자율성은 강압적 시민행동과 파괴적 발언 간의 정적 간접 효과를 조절한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는 직무 자율성이 높을 때 완화되고, 직무 자율성이 낮을 때 강화된다.
이는 구성원이 강압적 시민행동을 거쳐 분배 불공정을 인식하는 구성원의 부정적 행동을 완화하는 변인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직무 자율성의 중요성을 조직 차원에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다만, 구성원에게 시민행동을 하게끔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직무 자율성을 도입하는 것이 원활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Jada, U. R., & Mukhopadhyay, S. (2018). Empowering leadership and constructive voice behavior: a moderated mediated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Analysis, 26(2), 226-241.
시민행동압력(Bolino et al., 2010):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하도록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업무상의 요구
-> 구성원이 조직에서 느끼는 것을 묻고 있음
(1) 우리 조직에서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자주 느낀다.
(2) 우리 조직에서 '팀 플레이어'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3) 우리 조직에서는 추가적인 책임을 지고 추가 업무에 자원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크다.
(4) 우리 조직에서는 단순히 공식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5) 우리 조직에서 동료들은 종종 주어진 업무를 '그 이상'으로 수행하며, 나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6) 우리 조직의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업무의 일부로 요구되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7) 우리 조직에서 나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 이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자주 느낀다.
(8) 우리 조직에서 나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서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자주 느낀다.
(1) I feel a lot of pressure to go the extra mile by doing a lot of things that, technically, I don’t have to do.
(2) In this organization, the people who are seen as ‘team players’ are the ones who do significantly more
than what is technically required of them.
(3) There is a lot of pressure to take on additional responsibilities and volunteer for extra assignments in this
organization.
(4) Simply doing your formally prescribed job duties is not enough to be seen as a good employee in this organization.
(5) My co-workers often go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and there is a lot of pressure for me to do so as well.
(6) Management expects employees to ‘voluntarily’ take on extra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at aren’t technically required as a part of their job.
(7) Just doing your job these days is not enough there is a lot of pressure to go above and beyond the bare minimum.
(8) I feel a lot of pressure to work beyond my formally prescribed duties for the good of the organization.
강압적 시민행동(Vigoda-Gadot, 2007): 종업원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강압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이지 않은 역할 외 행동으로 정의됨(Vigoda-Gadot, 2007). 이는 상사/동료의 요청에 따른 종업원의 비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으로 개념화되어 진정하고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시민 행동과 구별됨(Vigoda-Gadot, 2006).
(1) 우리 조직의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업무 외의 업무 활동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2) 우리 조직은 공식적인 업무량 외에 공식적인 보상 없이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
(3) 우리 조직은 공식적인 업무 요건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이 직무에 투자해야 한다고 느낀다.
(4) 우리 조직은 공식적인 의무를 넘어 시간이나 에너지가 부족할 때에도 다른 교사를 도와야 한다고 느낀다.
(5) 우리 조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직무 의무를 넘어 상사를 도와야 한다고 느낀다.
-> 변인명이 강압적 시민 '행동'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수행하는 행동에 대해 묻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봄.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Vigoda-Gadot(2007)의 척도는 국내에 있는 시민행동압력 문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이며, 해당 척도가 실린 논문은 해외의 시민행동압력 문헌에도 자주 언급되는 논문임.
즉, 본 논문에서는 시민행동압력과 강압적 시민행동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기 보다 여러 개념을 혼재한 상태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